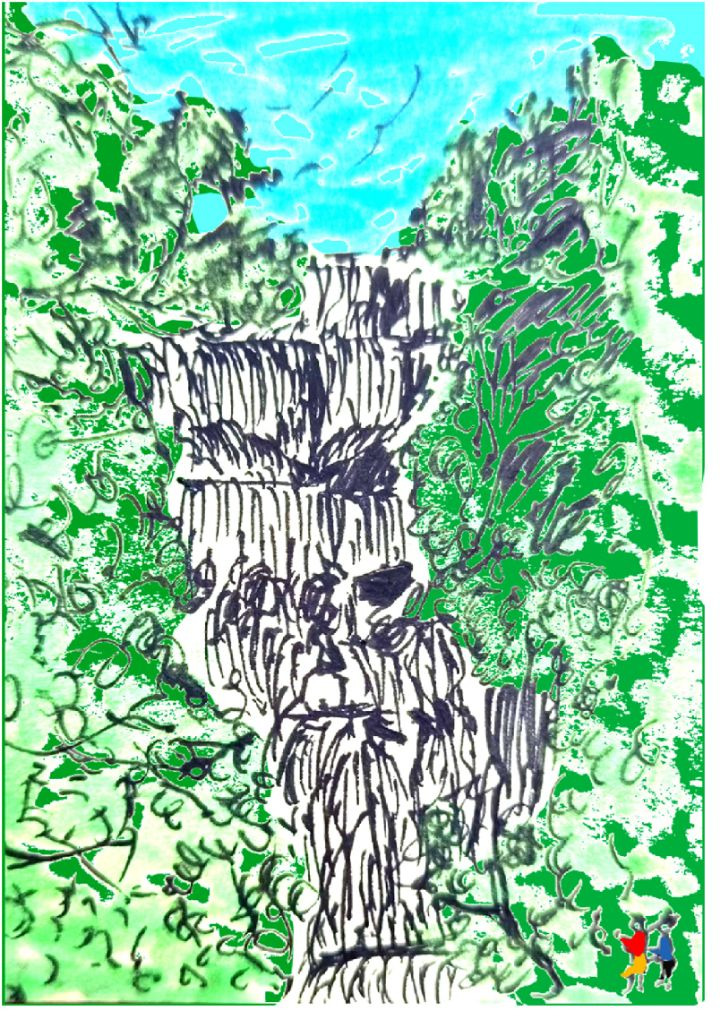
칠월의 마지막 주말이다. 상하이에서 고속철로 두 시간이면 닿는 저장성 타이저우(台州) 시 북부 텐타이현(天台县)에 있는 천태산(天台山)을 다녀올 요량이다.
집 앞에서 다섯 시 반경 택시를 타고 홍챠오 기차역으로 향했다. 평소처럼 첫 전철을 타면 열차 시각에 맞춰 도착하기 어려웠을 터였다. 출행에 대비해서 어제 퇴근을 하면서 아파트 근처 검사소에서 핵산 검사를 해두었고, 아침에 스마트 폰에 '음성'임을 알리는 녹색 큐알코드를 확보했다.
중국 곳곳 시시 때때 변하는 코로나 상황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방역 정책을 일일이 알아보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기 싫다면 긴 주말 내내 찜통 같은 도시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태풍 '송다(Songda)'가 오늘 오후 상하이 앞 먼바다를 지나 황해 쪽으로 북상할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이른 아침 코발트빛 하늘은 고요하기만 하다.
기차역은 예나 다름없이 사람들로 붐비지만 평소처럼 혼잡스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차분해 보인다. 쟈싱(嘉兴) 항저우(杭州) 샤오싱(绍兴) 셩저우(嵊州)를 거쳐 천태산(天台山) 역에 닿을 고속열차 푸씽호(复兴号)는 예정된 시각 06:33에 출발했다. 이내 교외로 탈출한 열차는 차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녹색 평원 위에 띄엄띄엄 농가들이 자리한 목가적인 풍경을 펼쳐 보인다. 뜬금없이 1997년 벨기에에 머물 때 버스로 찾아갔던 브뤼셀 교외의 워털루 평원이 떠올랐다.

쟈싱 남역을 지나자 하늘은 솜사탕처럼 흰 뭉게구름을 한껏 피워 올렸다. 헐렁하던 객실은 항저우 동역에서 빈 좌석 없이 승객들로 가득 찼고 조용하던 객실은 갑자기 대화 소리로 떠들썩해졌다.
열차는 두 시간 조금 넘게 걸려 천태산 역에 도착했고, 뭉게구름이 떠있는 코발트빛 하늘과 분지처럼 산군에 아늑하게 둘러싸인 도시 모습이 마치 강원도 평창에 온 느낌이 든다. 중국 지형이 동저서고(东低西高)라는 상식과는 달리 동쪽 바다에 접한 타이저우가 이처럼 산수가 수려한 곳이라고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었다.
역사 밖 멀리 파스텔 톤의 그림처럼 고운 하늘과 미색 구름을 인 능선이 손짓하고 있지만 역사를 빠져나가기 전에 방역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지역별로 구분된 출구, 인적사항 확인, 출구 바깥 임시 천막 검사소에서 비강과 후강 점액 모두 채취해서 실시하는 핵산 검사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시골스럽기까지 한 이곳 작은 역사에서의 방역 절차는 그 어느 곳 보다 삼엄하고 철저하다. 열차 도착 후 반 시간 여만에 방역 절차를 마치고 역사를 빠져나왔다.
여행객은 그리 많지 않은데 승강장에는 행선지별 빈 버스만 여러 대 정차해 있고 택시는 잘 눈에 띄지가 않는다. 한참 만에 빈 택시 한 대가 승강장으로 들어와 중국인 부자와 합석을 했는데 먼저 탄 승객의 목적지가 천태산과 반대 방향이다. 이곳이 고향이라는 택시기사는 국청사(国请寺)와 경태선곡(琼台仙谷) 중 국청사 쪽을 적극 추천한다. 천태산 관광구는 13개로 나눠지는데 당일치기 출행이다 보니 소요 시간과 마지막 열차 시각 등을 고려해서 두 곳 정도를 둘러볼 요량이다.

천태종의 발원지 국청사
국청사(国请寺)로 난 숲길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계곡에 걸린 무지개 모양 돌다리 풍간교(丰干桥) 부근에서 택시에서 내렸다. 다리 위쪽과 아래쪽 계곡에는 사람들이 얕은 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쫓고 있고, 다리 건너편 '수대 고찰(隋代古刹)'이라는 글이 쓰인 담장 뒤 국청사 입구에는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다. 10시 정각에 국청사 경내로 들어섰다.
수나라 때인 598년에 창건된 고찰 국청사는 천태종 발원지로 알려져 있다. 특이하게도 사찰 맨 앞쪽 정면에 위치한 미륵전을 지나자 사천왕상이 지키고 있는 우화전(雨花殿)과 그 좌우에 종루와 고루가 자리한다. 그 앞마당의 대형 향로에 꽂힌 굵고 긴 붉은 향초에서는 불꽃과 연기가 자욱이 피어오르고 있다.
우화전 뒤 대웅보전 앞마당에는 수령이 족히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녹나무와 측백 네 그루가 당당하게 서있다. 나무 옆에 세워둔 "하나의 화초에도 불성이 있다."라는 푯말에서는 우주만물 작은 존재에서 조차 깨달음의 단초를 찾으려는 치열한 구도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대웅보전 앞 마당은 향연으로 가득 찼고 나뭇가지와 대웅전 지붕 사이로 빼꼼히 내민 파란 하늘은 연꽃처럼 새하얀 뭉게구름과 어우러졌고, 어디엔가 남아 있을 법한 작은 공간마저 유람객들 말소리와 매미 울음소리가 메꾸어 버린 듯하다.
대웅보전 정 중앙에 좌정한 석가모니불 양옆으로 아난과 가섭 두 존자가 옹립하여 섰고, 좌우 벽면에 십팔나한, 뒤쪽 좌측 모서리에 코끼리 등에 앉은 진리와 수행의 덕을 맡아보는 보현보살, 뒤쪽 우편 모서리에 사자 등에 앉은 복덕과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이 각각 자리하고 있다. 한편, 석가모니불 뒤편 벽면엔 좌우로 선재동자와 용녀가 협시하고 있는 남해 관음(南海观音)이 보병을 거꾸로 든 채 자비의 물을 사해로 흘려보내고 있다.





대웅전 뒤 약사전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사찰 맨 뒤 가장 높은 자리에 천수천안 관음 입상과 그 앞에 순백 석조 관음상을 모신 관음전이 맞이한다. 이 관음전은 LA의 국청사 호법회(护法会) 회원들이 십오만 위안을 기부해서 조성한 것으로 1983년에 개광대전( 开光大殿) 법회를 열었다고 하니 이역만리 거리도 깊은 불심의 행로를 가로막을 수는 없었나 보다.
관음전 좌측으로 난 회랑을 지나면 '한중 천태종 조사 기념당'이라는 현판이 걸린 전각이 맞이한다. 중국 천태종의 종조인 지자 대사(智者大师, 538—597), 고려로 천태종을 들여온 대각국사 의천, 천태종 중흥조 상월 대사 세 분의 조상이 자리하고 있다. 중한일 3국의 천태종이 이곳에서 유래했다니 국청사는 동북아 3국 모두에게 특별한 불교 성지라고 할 수 있겠다.
아름드리 수목, 자욱한 향연, 마당마다 연꽃 가득한 석조 등이 어우러진 경내의 약사전, 가람전, 삼성전, 나한당, 방생지(放生池) 등을 수박 겉핥듯 둘러보고 국청사를 빠져나왔다.
풍간교(丰干桥)를 건너고 나란히 도열한 칠불탑 앞을 지나서 산기슭으로 100여 미터 오르면 수탑(隋塔)이 위풍당당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 탑은 국청사가 창건된 598년 진(晋) 왕 양광(杨广)이 지자 대사로부터 보살계를 받고 세운 보은 탑으로 탑신 높이 59.4미터 전탑으로 저장성에서 가장 높은 불탑이라고 한다. 밑바닥부터 하늘 높이 차곡차곡 쌓인 탑신의 저 전돌들이 천 수백 년의 긴 세월을 견뎌왔다는 것이 좀체 믿기질 않는다.



대폭포와 경태선곡으로
정오쯤 국청사 여행자 안내소에서 친절한 중년 여성 안내원이 안배해 준 미니버스로 지척에 있는 텅 빈 터미널 환승장으로 이동하여 버스로 옮겨 타고 7km여 거리 대폭포 입구로 출발했다.
천태산 자락을 시곗바늘 방향으로 얼마쯤 휘돌아 가니 저 멀리 양쪽 능선 사이 계곡 높이 걸린 대폭포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여행자 안내소에서 대폭포(大瀑布)와 경태선곡(琼台仙谷) 두 곳을 둘러볼 수 있는 표를 80위안에 끊었다. 풍경구 안으로 들어서자 구름을 인 능선 사이 높은 폭포에서 떨어져 내린 물이 흘러든 구룡호가 맞이하는데, 폭포의 물소리와 매미 울음소리가 뒤섞여 귀청이 따가울 지경이다.
천태산 대폭포는 낙차 325미터, 최대 폭 90미터로 '중화 제일 고폭(中华第一高瀑)'으로 불렸다고 하며, 왕희지 이백 육유 서하객 등 많은 문인 묵객들이 흠모해 찾아와서 많은 명구를 남겼다고 한다. 지금의 폭포는 1958년 동백(栋柏) 수력발전 댐이 건설되면서 사라졌다가 2020년에 인공적으로 재현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

옥사비류(玉梭飞流)라는 이름의 제9폭 아래에 서니 하늘과 맞닿은 높은 곳에서 층층 긴 비단 실타래를 풀어 늘어뜨린 듯 물을 흩뿌리며 수면으로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장관이다. 문득 여행자 안내소 앞 광장 한편에 서있던 시선(诗仙) 이백 석상과 "용루봉궐에 머물지 않고 날아올라 천태산에 가고 싶다(龙楼凤阙不肯住, 飞腾直欲天台去)"는 그의 시 <경태(琼台)>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폭포 옆으로 난 계단을 한 발 한 발 오르니 쏟아지는 물과 함께 밀려오는 바람이 시원스레 가슴으로 파고든다. 계단에서 햇볕을 즐기던 손가락 크기의 도마뱀 두 마리는 산객의 기척에 계단 옆 초지로 얼른 몸을 숨긴다.
뜨거운 햇볕과 상층부로 올라가는 가파른 계단길에 숨이 헉헉 막히고 다리는 흔들거린다. 몸과 다리는 무겁지만 어느 블로거의 글에서 본 폭포 속으로 난 통로와 경태선곡으로 연결된 잔도가 더욱 가관이지 싶어 마음은 오히려 발걸음을 재촉한다.
제7폭 유곡첩폭(幽谷叠瀑), 제6폭 현폭풍뢰(悬瀑风雷) 등 층층 제각기 다른 이름이 붙은 폭포 옆 계단을 따라 각 폭포와 어깨를 한 번씩 나란히 하며 그 장관에 연신 감탄사를 토해냈다.
제6폭포의 상단부 수진동(修真洞)은 도교 남종의 시조인 장백단(张伯端, 984-1082)이 도를 닦던 곳으로 경대오진단(琼台悟真坛)에서 도를 깨달아 <오진편(悟真篇)>을 지었다고 한다.
낭원선파(阆苑仙葩)라 불리는 제5폭포는 그 밑으로 뚫려 있는 동굴을 통과하면서 뚫린 암벽의 쏟아지는 물줄기 사이로 산 아래쪽 경관을 내려다보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낙차가 100여 미터에 달하는 제4폭포 군교쟁학(群蛟争壑)은 마치 한 무리의 용들이 앞다투어 물놀이를 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하는데 절벽에 수목에 가려 온전한 모습은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위쪽에 자리한 관폭정(观瀑亭)과 폭포 건너편 절벽을 따라 길게 이어진 잔도가 선명히 눈에 들어온다.

계단길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 눈을 피해 바지를 반바지로 바꾸어 입으니 끈적이던 허벅지 다리가 시원하고 한결 편해졌다. 산 아래 멀리 뭉게구름을 인 산군에 둘러싸인 텐타이현(天台县)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명치 위 가슴이 쓰리고 조여 오지만 걸음을 늦추고 호흡을 깊고 길게 하여 몸을 다독여 본다.
폭포 정상부에 올라서서 왼쪽 편 절벽에 걸린 2.5km 길이의 링윈잔도(凌云栈道)로 접어들어 산 모퉁이를 돌아서니 폭포는 능선 뒤로 숨고 짙은 청록색 물을 가두고 있는 인공호가 내려다 보인다. 어디선가 들려오던 펑펑펑하는 소리는 폭포 저 건너편 눈에 들어오는 사격장의 포연으로 보아 사격 연습을 하는 소리로 정체가 밝혀졌다.
먼 하늘에서 마른천둥소리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린다. 이번 태풍 '송다(Songda)'는 베트남의 강 이름에서 따온 명칭이라는데 2016년 10월에 이어 금년에 5호 태풍으로 다시 찾아왔다. 태풍 이름은 태풍위원회가 2000년부터 아태 지역 14개국에서 제출한 140개 고유 이름을 차례대로 붙인다고 하니 지난 6년 간 140개의 태풍이 생겨나고 사라져 간 셈이다.
하늘에 피어난 미색 뭉게구름이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저께 괌 북북서 쪽 약 1,18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해서 북상 중이라는 '송다'의 세력은 아직까지 이곳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는 듯 보인다.
경태선곡에 소요되는 시간을 가늠해 보며 자꾸 시계를 들여다본다. 돌이켜 보면 인생도 한바탕 유람이라 긴 듯 하지만 순식간에 청춘의 설렘이 지나가고 불혹과 지천명의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고 이순의 고개를 넘으면 어느덧 황혼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링윈잔도가 끝나는 지점 평탄한 대나무 숲길 모퉁이에 자리한 매점 냉장고에서 '빙탕쉐리(冰糖雪梨)' 한 병을 꺼내 들이켜니 가슴에 맺혀 있던 쓰림이 찬 음료와 함께 쓸려 내려가는 듯 시원하다.


계곡 위에 180미터 길이 현수교인 적선교(滴仙桥)가 천 길 계곡 위에 걸쳐 있다. 또 다른 현수교인 총 길이 345미터의 회선교(会仙桥)를 건널 때는 유리 바닥 아래 끝이 없어 보이는 계곡이 오금을 저리게 한다.
원효(元曉, 617-686)는 당나라 유학 길 한밤중 동굴에서 잠결에 달게 마신 바가지의 물이 아침에 일어나 파묘 속 해골물임을 알고 기절초풍을 했다지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큰 깨달음을 얻고 해동 고승으로 우뚝 자리하게 되지 않았던가. 적선교와 회선교는 각각 180명과 1200명이 동시에 건널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데, 회선교 위를 기껏 네댓 명이를 지나고 있을뿐인데 이렇듯 두려움에 온몸을 움츠리는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 가소롭고 안쓰러울 뿐이다.
출렁다리 두 개를 건너면 능선 마루에 돌기둥 스무여 개가 둘러선 황제 제단이 자리하는데, 이곳에서 황제가 천지인 삼단(三坛)을 세우고 하늘, 땅, 조상에게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천태산 북동쪽의 최고봉인 해발 1098미터의 화정산(华顶山)을 비롯하여 수많은 비경과 사찰을 품고 있는 유불도의 성지로서 황제의 제단이 있을 법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산객들이 간이의자에 앉아 허기와 갈증을 달래고 있는 천제단 바로 아래 매점에서 음료수 한 병으로 갈증을 달랬다. 매점 주인은 바로 위쪽에 경태선곡의 위쪽 출구가 있고 계곡을 관통해서 아래편 출구로 빠져나가려면 한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더위와 수많은 계단에 지친 몸이 이끄는 대로 상부 출구로 나서서 잠시 버스를 기다려 보다가 경태 선곡을 지척에 두고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되돌려 발길을 계곡 쪽으로 옮겼다. "오악에서 돌아오면 다른 산을 보지 않고, 경태(琼台)에서 돌아오면 다른 계곡을 보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한 마리 학이 날개를 펼친 듯 날렵한 지붕의 정자 과학대(跨鹤台), 한탄강의 비둘기낭 폭포를 연상시키는 백장폭(百丈瀑), 장백단이 도를 깨우쳤다는 오진단(悟真坛), 팔선(八仙)이 장백단에게 도를 전수한 곳이라는 구봉대(九峰台), 기둥이 하나도 없이 호수에 접한 절벽에 기와지붕을 걸친 현공랑(懸空廊), 팔선호(八仙湖)의 링파(凌波) 잔도를 차례로 지나고, 호수를 가두고 있는 댐 위의 선호랑교(仙湖廊桥)와 바위를 뚫어서 낸 통로인 선호동(仙湖洞)을 거쳐 여행자 안내소 쪽으로 내려섰다. 급전직하 기암절벽, 그 절벽에 걸쳐 있는 잔도, 좁고 가파른 계단, 폭포와 계곡, 호수 등에 정신이 팔려 그림 같은 비경 속을 순식간에 지나서 빠져나온 느낌이다.

시간은 15:30경으로 여유롭지만 집착과 번민은 끊기 어려운 것인지 경대 선곡 입구 광장에서 막 출발하려는 셔틀버스로 뛰어가서 올라탔다. 여행자 안내소 주차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버스는 달랑 나 혼자를 태우고 이내 고속철도역으로 출발했다. 기차역에 닿을 즈음 유리창에 굵은 빗줄기가 두둑 거리며 내리치기 시작했다. 상하이에서 먼길을 달려온 객이 오늘 하루 여정을 마칠 때까지 물에 빠진 생쥐 꼴을 면하게 해 주려는 태풍 송다의 배려였을까.
타이샨 역사에는 도착 승객들이 방역 절차를 밟느라 출구 쪽에 모여 있고 빗줄기는 더욱 세차게 내리친다. 빗줄기가 주춤해진 틈을 타서 입구 쪽으로 달려가서 장쑤마 스캔 등 방역 확인 절차를 거치고, 배낭 엑스레이 및 신변 검색 후 널널해 보이는 너른 대합실로 들어서서 의자에 몸을 앉혔다.
예약해둔 열차 시각까지는 거의 세 시간이 남았는데 한 시간쯤 앞에 출발하는 열차는 빈 좌석이 없다. 그토록 애간장을 태우며 앞뒤로 재던 소중한 시간을 썰렁한 역사에 앉아서 허비할 도리밖에 방도가 없어 보였다.
하루의 여정을 되돌아보니 "죽은 제갈량이 산 중달을 달아나게 했다."는 삼국지의 일화처럼, 이처럼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모른 채 대협곡 여정 내내 시간에 쫓기듯 마음을 졸였으니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그러면서도 혹시 누군가 기차표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예매 어플의 '변경(改签)' 버튼을 인터벌을 두고 반복해서 눌러보았다. 대개 수고로움 뒤에는 보상이 따르듯 18:55발 열차를 18:12발 열차로 바꾸는 데 성공하여 상하이에는 아홉 시 이전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 한편에 자리한 작은 매점에서 핫바 하나를 사서 출출함을 달랬다. 화장실에서 땀이 흥건한 내의와 셔츠를 갈아입으니 몸과 마음도 한결 상쾌해졌다. 집을 나설 때 챙겨간 복숭아와 믹스 커피도 번잡한 생각을 거두고 잠시나마 여유를 되찾는데 도움이 되었다. 밤 열 시 안에 집에 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냉장고 속 칭다오 병맥주 한 병이면 짧았지만 길었던 여정의 피로를 날려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차이나 오디세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충밍도(崇明岛; 숭명도)의 흔들리는 갈대 (1) | 2024.08.31 |
|---|---|
| 차(茶)와 인생, 텐산 차청(天山茶城) (0) | 2024.08.31 |
| 신창(新场) 구쩐, 수향의 짙은 물빛 (1) | 2024.08.31 |
| 류저우(柳州) 명산 어드벤처 (0) | 2024.08.29 |
| 쩐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료진열관과 펄벅기념관 (0) | 2024.08.29 |